불이(不二)의 길 깨닫는 정진의 한 소식들 담아
“우리는 길 위를 걷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연을 만들어 간다. 그를 통해 자기만의 인생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즉, 우리의 삶은 길 위에서 시작돼 길 위에서 끝이 난다. 대다수가 반듯하고 넓은 ‘대로’나 ‘지름길’을 찾지만 일휴(一休) 김양수 작가는 반듯하지 않고 굽어 있는 길, ‘에움길’에 주목했다.”
선화(禪畵)와 선시(禪詩)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고요를 선사하는 김양수 작가는 작년 전시에서는 하늘길과 물길, 바람길, 인생길을 그림으로 풀어냈다. 내가 걷고 있는 길, 내 자신이 걸어온 길에 감사하고 사유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화폭에 담았다.
당시 그의 소회를 잠시 옮겨본다. “마음을 낮추고 감사하며 굽이굽이 에워서 돌아가는 인생길 같은 인연의 모퉁이에서 바람처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을 붓 끝에 담았습니다. 붓 가는 길과 마음 가는 길이 결코 둘이 아님을 아는 것, 그 근원을 찾아 가만히 화선지를 폅니다.”
김 작가는 모교인 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서울에서 활동하다 고향인 진도 여귀산으로 귀향해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60년 전남 진도의 한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김 작가는 태생적으로 바다보다는 산과 들을 친구 삼으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새벽이슬에 옷깃을 적시며 소에게 풀을 먹이거나 산과 들을 품은 안개와 자유롭게 떠도는 구름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에 아련히 마음을 빼앗기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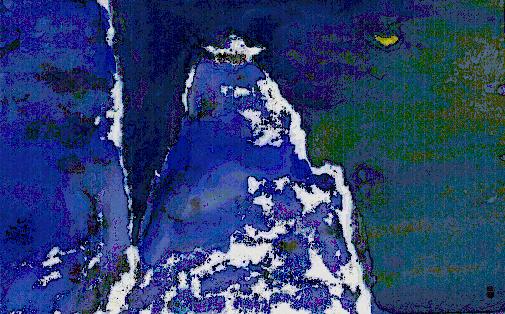
유년시절 품었던 자연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화가가 된 이후 즐겨 다루는 그림과 글의 소재가 됐다. 더불어 마음 한 켠으로 생의 근원 찾는 일에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어린 시절의 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김 작가에게 자연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요체(要諦)이자 동체(同體)라고 강조했다.
낙향한 김 작가는 여귀산 자락에 ‘고요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작업실이자 수행처인 적염산방(寂拈山房)을 열어 작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하며 만들어낸 신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그의 신작들은 깊었던 먹색을 덜어내고 청색이 주류를 이뤄 청량감으로 가볍게 다가온다. 또한 텅 빈 듯 하지만 꽉 차고 꽉 찬 듯 하지만 텅 비어 오묘한 서정성으로 감성을 자극한다. 그림과 함께 김 작가의 쓴 짧은 자작시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동국대 미술학과와 중국 중앙미술학교 벽화과에서 수학한 김 작가는 지난 1996년 갤러리2020에서 남도기행 전시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30차례에 걸친 개인전을 열었다. 2012년 독일 쾰른국제아트페어 초대전 등 영국과 독일,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초대전을 9차례 갖기도 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얻은 깨침으로 <내 속 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 등 시화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오직 모를 뿐”
내 몸 안에서 가장 먼 곳이 ‘머리와 가슴 사이’라고 한다. 곧 이성과 감성의 차이를 불교는 릴렉스하게 설명하고 있다.
색과 형상은 마음을 이전하려는 정심이지만 정작 그 색과 형상은 본디의 존재성을 벗어나버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하여 “오직 모를 뿐”이라고 숭산스님은 간결하게 설파하였다. 우리의 묵화는 형을 그리되 형을 뛰어넘는 공의 세계를 지향한다. 부처는 눈을 꼭 감고 천년의 이끼라는 가사를 두른 채 졸고 있다. 꽃이 핀다는 것은 깨달음이지만 오랜 관습과의 결별이다. 부리가 온통 붉게 물들이는 쪼아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미완성의 방하착하려는 가장 세속적인 평화, 질서가 없는 질서의 세상, 우리가 깊이 갈망하는 미륵세상, 이상향은 법과 우상이 화목으로 불타사라지는 한 순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일휴의 붓점은 머물면 점안이 되고 흐르면 강물이 된다. 바람을 그리되 바람의 형체를 느끼지 못하고 달을 그리되 달이 테를 두르지 않는다. 산다는 것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일수일안으로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며 헤아릴 줄 아는 그 경지가 어디 산 그늘에서라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천만가지 자기 번뇌를 간추리기 위해 이곳 여귀산자락을 가피로 삼아 그 또한 날 선 푸른 납자의 시절을 다시 찾고 있으리라 믿는다. 어찌 이 생에 휴가 있겠는가. 모두 부질없다는 풀과 꽃도 가장 존귀해진다는 여귀산의 모성을 그 rskruf한 음으로 담고자 하는 일휴 김양수화백의 명상록을 함께 펼쳐보기를 권한다.(박남인)
그는 전통산수화의 요체인 산과 수를 감히 생략해버린다. 대신 꽃들은 형태에 속박되지 않고 번짐을 통해 향을 더한다. 꽃을 꽃이라 하면 꽃은 쉬이 시들 뿐이다. 산도 물도 아닌 산수가 적멸하고 벙어리 부처와 꽃이 자리한다.


